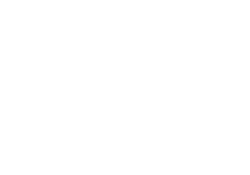7. 식민지하의 극단 생활
극단을 이끌며 정처없이
이렇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공연을 다녔지만, 창극단 시절 고생도 참으로 많이 했다. 당시 태평양 전쟁이 말기에 치달을 무렵, 우리 창극단은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 강원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그리고 강계 만포를 거쳐 신의주를 건넜고 만주와 봉천, 하얼빈, 목단강을 끼고 훈춘, 길림, 목단강까지 진출했다.
훈춘과 길림 지방을 돌 때는 전시라서 먹을 것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공연하고 다녔던 기억도 난다.
먹을 것이라고 겨우 콩지게미에 보리와 조가 보일 듯 말 듯 섞이고, 쌀은 어쩌다가 하나씩 눈에 띄는 밥이었는데 수저로 밥을 떠먹을라치면 밥은 다 흘러 내리고 숟가락 한가운데 조금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굶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당시에 우리는 이거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먹었는데, 이것도 조금 먹다가 남겨 두고 공연이 끝나면 먹곤 하였다.
한번은 공연이 끝나고 먹을 양으로 밥을 남겨 꼬옥 두었다가 강계에 도착해 그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김치가 없었다. 강계는 기후가 추운 곳이라서 김치를 소금에 절여 담을 곳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 나가 김치 한포기를 샀는데, 그때 돈으로 10전을 주니까 배추를 큰 포기로 담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사온 김치를 방에다 묻어두고 공연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공연을 마치고 여관에 돌아온 나는 남겨 두었던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시레기가 다 된 김치 한가닥에 밥한숟갈을 미처 씹을 여유도 없이 마구 집어 넣는데도 그 맛이란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물어물 밥을 밀어 넣었는데도 체하는 법도 없었고, 서너 숟가락 떠먹고 냉수 한사발 벌컥벌컥 마시면 배가 불러와서 그제서야 잠을 청하곤 했다. 요사이도 나는 밥맛이 없거나, 입맛이 떨어지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입맛이 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니, 그때 고생이 상상이 가리라.
그 후 시절이 바뀌어 내가 밥술이나 먹고 살 때에도 거지들이 와서 밥을 동냥하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내 밥이라도 덜어 주곤 했던 생각이 난다.
고생은 이것 뿐만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무대 분장으로 쓰이는 화장품이 무척이나 귀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기억나는 화장품으로는 박하분과 몇가지 약품을 섞어 만든 시훈이라는 화장품을 썼는데, 이 화장품을 지울 구리모(크림)가 없어서 돼지 기름이나 석유로 지우곤 했었다. 지금은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것을 크린싱 크림이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화장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공연 횟수였다. 하루에 3회 공연은 보통이었고, 일요일에는 4회씩 공연을 해야 했다.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도 나는 몸살 한 번 앓은 일이 없었다.
옛말에 예술인과 정치인은 보통 사람보다도 열배 이상의 정열을 타고 나야 한다는 말이 맞는가보다.
언젠가 나는 강원도에 갔다가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데, 며칠 앓다가 벌떡 일어나니 단원들이 나를 보고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박여사 정말 강철이오. 강철.” 이라고 말했던 생각이 난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술과 약품으로 인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폐인이 되거나 세상을 뜨는 일도 많았다. 물론 요즘도 가끔 연예인들 사이에서 무슨 마약이니, 대마초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는 이런 광경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선 몇가지 결심을 하였다.
첫째, 비록 예술을 할지언정 허튼 일로 자신의 일생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겠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늙어서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바느질과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바느질과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두면 하다 못해, 부잣집 침모나 찬모로 들어가 돈도 벌고, 음식도 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여름 한철과 겨울 한철에 흥행이 안돼 극단이 쉴 때는 집에서 저고리 꾸미는 법과, 재봉침 박는 법을 배워 매일같이 내 옷을 만들어 보았고, 또 음식 잘한다는 집을 찾아 다니면서 같이 일도 해주고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스런 생각을 다했구나 싶지만, 아무튼 그 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그런 쪽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지 큰 무리없이 술 담배 같은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물론 과거에 극단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놀 기회가 있으면 한잔씩 마시기도 했었다. 술을 마시면 평상시에 나에게 섭섭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풀어버리자고 하고 재미있게 놀게 되니까 가끔 술을 마시자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활이 원체 바쁘다 보니, 술을 마실만한 이런저런 기회도 없어 결국 술을 입에 대질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70이 넘어서까지도 특별한 병치레 한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온 것도, 아마 젊은 시절에 허튼 곳에 함부로 몸을 혹사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일제의 창극탄압과 신의주에서 맞은 해방
요즘 사회 일각에서 정신대 문제가 한일간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 식민지하에 있었던 우리의 쓰라렸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운동이 한창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젊은 시절. 한참 인기를 끌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던 시기가 바로 일제 식민지 치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극예술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연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시작할 무렵 극에 달했다. 우리 선배님들 말을 빌리면, 점차 사라져가는 국악의 맥을 잇고자 1933년에 만든 ‘조선성악연구회’마저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리고 우후죽순 생기는 창극단체들을 경무국(지금의 경찰청에 해당됨)에서 감독하고 간섭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창극 공연에서 대사의 일정 부분을 일본말로 공연하지 않으면 공연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핍박을 가해왔다. 만약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치도곤을 맞았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우리 말로도 어려운 창극대본을 일본말로 하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 없고 어려운 주문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일본말을 잘 모르는 단원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국악 활동이 침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이상후씨라는 분과 함께 일본말로 대화를 주고 받는 토막극 형식을 레퍼토리에 끼어 넣어 겨우 구색을 갖추고 공연을 다녀야 했다.
그러나 저들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심해졌다. 한번은 동일가극단에서 한창 인기가 높았던 ‘일목장군’을 공연할 때였다. 경무국에서 사람이 찾아와 대본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요구 내용은 극중 마지막 내용인 클라이맥스 부분인데, 일목장군이 백제의 재건을 위해 발해로 떠나는 내용을 일본으로 가는 내용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만약에 대본을 수정하지 않으면 공연을 중지 시키고, 극단을 해체시키겠소.”
그들은 거의 협박조에 가까운 으름장으로 대본 수정을 요구해왔다. 아무리 창작 대본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역사극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저들의 발상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힘없는 식민지 민족이 어이하랴. 그들 요구대로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부분을 고쳐서 공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단원들은 일본 감독관의 감시가 조금만 소홀하면 재빠르게 원래 대본대로 수정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한번은 발각이 되어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일목장군의 공연은 인기는 있었지만 이런 수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민족의 자주 독립을 고양하는 주제를 피해야 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공연물을 올려야 하는 슬픔도 맛보아야 했다.
동일창극단을 이끌면서 인기과 박수를 한몸에 받았지만, 정말 남모르는 탄압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음악을 한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은 가슴 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렇게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전국을 순회하고 다닐 무렵, 그렇게 바라고 열망하던 해방을 맞게 되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고, 임진왜란때는 선조대왕이 왜군을 피해 피신했던 신의주에서였다. 그곳에서 해방을 맞는 기쁨은 참으로 야릇한 것이었다.
|